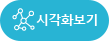| 항목 ID | GC40201262 |
|---|---|
| 영어공식명칭 | Eosayong (Farmers’ Song) |
| 이칭/별칭 | 초부가(樵父歌),얼사영,가마구타령 |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문화유산/무형 유산 |
| 유형 | 작품/민요와 무가 |
| 지역 | 대구광역시 동구 평광동 |
| 시대 | 현대/현대 |
| 집필자 | 정서은 |
| 채록 시기/일시 | 1995년 5월 27 - 「어사용」 권오경, 김기현 채록 |
|---|---|
| 채록지 | 「어사용」 -
대구광역시 동구 평광동 |
| 가창권역 | 「어사용」 - 대구광역시 동구 평광동 |
| 성격 | 노동요|가창유희요 |
| 토리 | 메나리토리 |
| 출현음 | 미·솔·라·도·레 |
| 기능 구분 | 노동요 |
| 형식 구분 | 독창 |
| 박자 구조 | 불규칙 박자 |
| 가창자/시연자 | 송문창 |
대구광역시 동구 평광동에서 부르던 나무꾼 신세타령.
「어사용」은 주로 경상도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불리던 나무꾼 신세타령이다. 산에 나무하러 가서 일을 하다가 힘들고 두려움을 느끼면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그래서 노동요로 볼 수도 있고, 나무할 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불렀기 때문에 가창유희요로도 볼 수 있다. 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 주가 되어 신세한탄요로도 본다.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해롭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 ‘이후후후’하는 입소리를 내어 동물과 귀신을 쫓는다고 한다.
「어사용」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내 한국민요대관에 음원이 수록되어 있다. 채록일은 1995년 5월 27일이고 채록자는 권오경과 김기현이다.
「어사용」은 깊은 산속에서 혼자 부르는 독창 형식이다.
대구광역시 동구 평광동의 「어사용」의 사설은 주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며, 내용이 모두 구슬프고 애절하다.
에이 바람아 강풍아 불지 마라 서풍낙엽에 다 떨어진다
이--호--어 슬프다 우리 낭군님은 점슴 굶고 나무하러 가네--이
이 호-호-호 어떤 사람은 팔자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영화로이 살건마는
이-호-호 내날 적에 너도 나고 너 날 적에 나도 났는데 이 내 팔자는 이--왜이러노
짚신짝도 짝 있는데 이 내 나는 짝이 없노
만첩산중 고목나무는 겉이 썩어야 남이 알지요 니 속 내 속 다 썩는 줄 어느 누구고 알아 주네
이 이-호-호-어 -이여 명사십리 해당화야 오- 꽃진다고 서러마소 오-오 명년 삼월 또 닥친데 오-이 우 -우- 요- 우-이 예
이-호-우-예 이-호- 우여 우여 봉봉이 두견화요 골골마다 행화초래이
나물묵고 물마시고 팔을 비고 누웠으니 대장부야 살림살이는 이만 하면은 넉넉하지 이 예
이-호 우여- 우여- 가다가 죽어지면은 어는 누구가 날 찾으리
현재는 나무를 하러 다니지 않기 때문에 「어사용」은 불리지 않는다. 다만 어릴 적 어사용을 들어보았거나 불렀던 이들의 기억 속에 단편으로 남아있고, 각 농요보존회에서도 전승노력을 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평광동의 「어사용」은 지역의 음악어법인 메나리토리로 구성되어 있고다. 또한 사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 조동일, 『경북민요』(형설출판사, 1977)
- 김영운, 「영남민요 어사용의 음조직 연구」(『한국민요학』6, 한국민요학회, 1999)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어사용